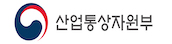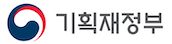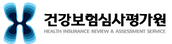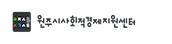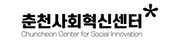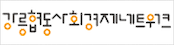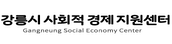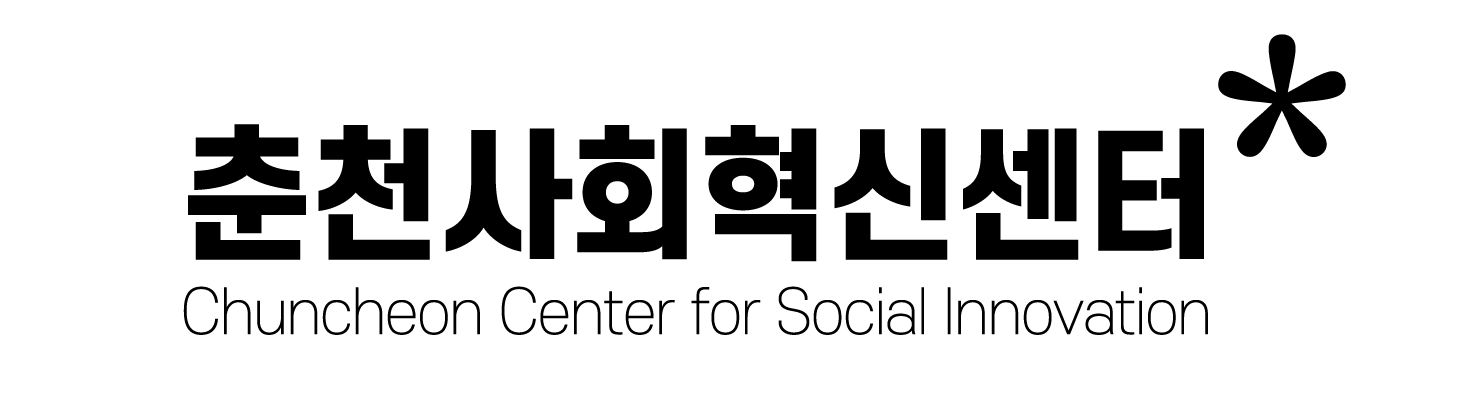[춘천사람들/1102] [이슈논평] ‘놀라움’이 ‘시시함’이 되지 않으려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20-11-03 09:36 조회1,837회 댓글0건요약글
요약글 :관련링크
본문
[이슈논평] ‘놀라움’이 ‘시시함’이 되지 않으려면

나정대 (‘교육과 나눔’ 이사장)
필자가 처음 사회적경제라는 단어를 들어본 건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일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선배에게 사기를 당하고 방황하던 나를 잡아준 건 민주노동당이었고, 그 민주노동당에서 엄형식이라는 후배를 만나면서 사회적경제를 처음 접한 것 같다. 처음 사회적경제라는 단어와 그 내용을 접했을 때는 ‘그저 그렇다’라는 느낌이었다. 많이 퇴색해지긴 했지만 당시까지도 나의 마음 속에는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뒤집어야 한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자리잡고 있었기에 어쩌면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가치가 시시하게 느껴졌으리라.
시시하게 느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사회적경제를 이론으로 처음 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이론으로서의 사회적경제는 한국사회에 도입된 지 얼마되지 않았고, 대체적 관점이냐 혹은 보완적 관점이냐 라는 입장으로 나뉘어 다투고 있었다. 대체적 관점은 시장자본주의를 사회적경제로 대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보완적 관점은 시장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시장실패를 사회적경제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물론 한국사회에서 사회적경제를 연구하는 주류의 입장은 보완적 관점이었다.
사회적경제를 시시하게 바라보던 나의 생각이 바뀌게 된 2가지 계기가 있었다. 첫째는 2009년 혹은 2010년에 다녀온 것으로 기억되는 유럽 사회적경제 현장견학이었다. 당시 국고지원으로 한림대학교 학부생들과 함께 벨기에와 프랑스 등을 다녀왔었다. 인상 깊었던 내용은 프랑스에 있는 릴시에 사회적경제 담당 부시장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릴시 전체 고용의 약 25%(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적어도 그 이상) 정도를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책임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발효된 지 얼마되지 않아 사회적경제가 아닌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만이 회자되던 시절의 대한민국과는 차원이 다른 사회적경제 현황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두 번째 계기는 2012년 강원도풀뿌리기업민관협의회 사무국장을 맡으면서였다. 당시 사회적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고용노동부에서 광역 단위별로 풀뿌리기업민관협의회를 만들었고, 강원도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강원도지역의 사회적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회적경제도 접하게 되었다. 당시 사회적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간병이나 집수리 유형 이외에도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기업을 접하게 되면서 사회적기업의 발전가능성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당시 강원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공정여행, 공연 관련 등 ‘혁신적인’ 사회적기업들이 속속 설립되는 모습에서, 나는 강원도와 춘천도 프랑스의 릴시처럼 사회적경제가 일자리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방정부가 될 것이란 기대를 했었다.
당시에 비해 강원도와 춘천의 사회적경제가 성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GRDP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1%가 안 될 것이며,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가 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2013년에 수립했던 ‘강원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에서 2018년까지 목표로 삼았던 사회적경제 업체 수 2천6개, 종사자 3만4천640명은 한낱 일장춘몽이었을까?
2018년까지의 목표가 현재로서는 일장춘몽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크게 2가지일 것이다.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모두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겠다는 다짐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다짐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하나일 것이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국민연금이 손을 들어준 것의 10%만이라도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둔다면 지금의 일장춘몽은 꾸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사회적경제 기업 간의 내부거래 활성화, 미약하지만 현재 조성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민간기금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조성 노력 등 민간 차원의 자발성이 더 확대되지 않으면 일장춘몽에 대한 비판을 공공기관에만 전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새는 하나의 날개로 날 수 없고, 두 손이 마주쳐야 손뼉 소리가 나듯 민과 관의 거버넌스 구조 구축 및 협업, 제도와 정책을 통한 관의 지원, 생태계 조성과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민의 노력이 없다면 프랑스 릴시에서 느꼈던 사회적경제에 대한 나의 놀라움은 ‘시시함’으로 시들어버릴지도 모른다.
출처 : 《춘천사람들》 - 시민과 동행하는 신문 (http://www.chuns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네이버
네이버